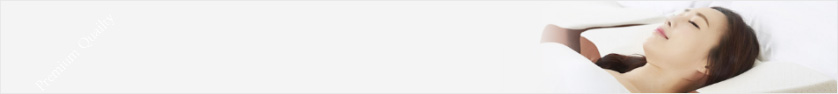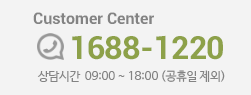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육소병어 작성일25-10-08 17:4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
 http://77.588bam2.top
0회 연결
http://77.588bam2.top
0회 연결
-
 http://99.yadongkorea.me
0회 연결
http://99.yadongkorea.me
0회 연결
본문
마로니에 꽃 핀 수형. 출처 미국 일리노이 모튼수목원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자는 말이 대학로에서 만나자는 말보다 더 좋다. 마로니에(Marronnier)는 가시칠엽수라는 나무. 밤나무를 닮아 밤(Marron)을 어원으로 하는 프랑스 말이다. 받침이 하나도 없는 이 단어가 주는 특유의 리듬감과 이국적인 정취가 나를 끌어당긴다.
나는 어릴 때 아빠가 즐겨 부르던 노래에서 마로니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임자 잃은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찾아보니 1971년 박건이 발표한 노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다. 아빠는 서울에서 마로니에공원을 오가며 사진을 배웠다고 했다. 아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빠는 어린 나와 언니를 마당의 키가 큰 감나무나 마을 어귀의 품이 너른 팽나무 아래 나란히 세워두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오래된 올림푸스 카메라 렌즈에 한쪽 눈을 갖다 대거나 떼면서 루루 루루 루루루, 아빠는 노래를 불렀고 나는 미지의 마로니에를 상상했다.
마로니에. 일러스거래량이동평균선
트레이션 차지우.
열매 떨어질 때 나는 가을의 소리, 슈슈슉 (침묵) 툭
대학로가 아니라 마로니에공원이 약속 장소로 호명될 때,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좀더 들뜨는 편이다. 아빠가 우리를 보며 행복하게 웃던 어린 날의 추억이 떠올라 일부러 그 노래를 찾아 듣는다. 아빠가 마로니에공원체리마스터 다운
을 드나들던 청춘일 때 나는 다만 우주의 보이지 않는 먼지였을 테지만.
마로니에 열매. 출처 영국 런던 아쿠아가든
지금은 가을의 초입이다. 마로니에의 큼지막한 열매가 무르익어 뚝뚝 떨어지는 때. 나는 요즘 이 열매가유진테크 주식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가 재밌어서 수목원의 마로니에 옆에 서서 자주 웃는다. 마로니에 잎은 작은 이파리가 다섯 장에서 많게는 일곱 장이 모여 커다란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칠엽수다. 거인의 손처럼 크고 넓다. 몇 장만 겹쳐도 무성한 느낌이 든다. 녹음수로 무척 좋은 것이다. 꼭대기에 달린 열매가 땅으로 내리려면 그 잎들을 통과해야 한다. 이평선매매
나무로부터 낙하를 시작한 열매는 커다란 이파리들이 이룩한 수풀을 헤치느라 샤샤샥 소리를 먼저 낸다. 반달 모양의 수관(樹冠)을 다 통과한 후엔 잠시 침묵한다. 그러고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툭 하고 착지한다. 열매 하나 떨어질 때 샤샤샥-침묵-툭, 또 하나 떨어질 때 샤샤샥-침묵-툭. 동시에 여러 개가 떨어지면 수선스럽기까지 하다. 샤샤샥과 툭 사이의 그 침묵 덕분에 떨어지는 열매를 내가 피할 시간이 생긴다. 마로니에 열매야말로 머리에 맞기라도 하면 제대로 꿀밤이다.
나무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열매가 정말 밤톨을 닮았다. 그런데 마로니에와 밤나무는 전혀 다른 혈통이다. 달리 말해 열매만 닮은 거다. 밤처럼 표면에 가시가 있고 그 껍질을 벗기면 밤톨을 닮은 게 나온다. 그래서 마로니에의 영어 이름도 말밤나무(Horse chestnut)다. 식용 밤은 아니라는 뜻에서, 또는 잎이 떨어진 후 나뭇가지에 남는 흔적이 말발굽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마로니에 열매를 콩커(Conker)라고 부르기 때문에 곳에 따라 콩커나무(Conker tree)로도 통한다.
마로니에 열매를 실에 매달아 서로 쳐서 깨는 영국 아이들의 놀이도 열매 이름을 그대로 써서 콩커라고 한다. 가을 초입에 마로니에가 있는 교정에 가면 키가 큰 나무에 달린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학생들은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다. 열매를 최대한 구하려고 이 나무 저 나무 찾아다녔다. 마로니에 아래 있던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앞으로 옮겨 갔다. 그럼에도 콩커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건 ‘세계콩커선수권대회’가 있어서다. 이 대회는 1965년 시작되어 해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 영국 노샘프턴셔주 애슈턴에서 열린다.
콩커 방식은 단순하다. 매듭이 있는 끈 끝에 마로니에 열매를 꿰고 두 선수가 준비한다. 더 강한 열매가 더 약한 열매를 부수면서 점수를 얻는 것이 룰이다. 끈에 매달린 두 개의 열매 중 하나가 부서질 때까지 번갈아가며 튕긴다. 끈의 길이와 끈을 매듭짓는 방법, 타격하는 횟수의 제한 등 국제적으로 정한 참가 규칙 또한 엄격한 편이다. 아이들끼리 놀 때는 열매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식초에 담그거나 뜨거운 오븐에 굽는 등 저마다의 편법을 쓴다.
영국에선 놀잇감으로, 독일에선 맥주 저장고 보호수로
콩커 게임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들을 동원해 마로니에 열매를 모은 적이 있다. 총알과 폭탄 등에 쓰이는 화약인 코르다이트(Cordite) 생산에 필요한 일종의 전분이 마로니에 열매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추억이 많고 프랑스 말이 잘 어울리는 마로니에지만, 그의 진짜 고향은 그리스 북부와 알바니아의 산지다. 17세기 초 영국으로 건너간 마로니에는 18세기에 활약한 조경사 케이퍼빌리티 브라운(1716~1783)의 총애를 받으며 전국 곳곳에 식재됐다. 재배지에서 벗어나 1815년 야생에서 처음 기록됐고, 심어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살 수 있게 됐다. 영국에 귀화한 것이다. 19세기에는 유럽의 더 많은 국가로 건너갔고 오늘날 프랑스 베르사유궁전과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센 강변의 대표 나무가 됐다. 독일에서는 양조장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계식 냉장 시설이 도입되기 전에는 양조업자들이 맥주의 발효와 숙성을 위해 지하 저장고를 팠다. 여름철 더위로부터 저장고를 보호하기 위해 잎이 무성하되 뿌리가 얕아 땅속 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나무가 필요했다. 마로니에였다. 그렇게 이어진 마로니에 녹음 아래에서 맥주를 파는 풍습은 비어가르텐(Biergarten)으로 발전했다.
마로니에는 최대 40m까지 자랄 수 있다. 큼지막한 잎 덕분에 우듬지에서 내려온 반달 모양의 수관부가 유독 더 풍성하다. 봄에 꽃이 말도 안 되게 화려하게 핀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서 우후죽순 솟은 빵빠레(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보인다. 고흐의 1887년 작 ‘꽃이 핀 마로니에 나무’에 내가 본 그 개화 풍경이 딱 들어가 있다. 실제 개화 시기에 나무 가까이 다가가 꽃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빵빠레보다는 뭐랄까, 하얀 바탕에 붉은 무늬가 들어간 것이 그 비슷한 아이스크림 더블비얀코를 더 많이 닮은 것도 같다.
마로니에공원에 가도 사실 진짜 마로니에는 몇 그루 안 된다.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던 시절, 일본인 교수가 마로니에라고 심은 것이 유럽 원산의 마로니에(가시칠엽수)가 아니라 일본 원산의 칠엽수라 그렇다. 접두어 ‘가시’가 안 붙은 칠엽수는 말 그대로 열매에 가시가 없다. 마로니에(가시칠엽수)와 칠엽수, 그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마로니에로 통칭하던 때도 있었다. 최근에 심는 가로수는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한다. 때로는 마로니에를 더 많이 심는 경향도 보인다.
마로니에 원뿔모양 꽃차례. 출처 미국 일리노이 모튼수목원
키이우는 마로니에가 그리워
진짜 마로니에를 그것도 고목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마로니에공원이 아니라 덕수궁이다. 덕수궁 석조전 뒤 두 고목이 그 주인공인데 수령이 100년이 넘은 것으로 본다. 석조전 정원이 완성된 것이 1910년대 초반이니 적어도 그 무렵 또는 그 이후 심었으리라 짐작해서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로니에다.
마로니에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사는 국가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도시 키이우. 키이우는 수많은 광장에 이 나무가 가득해 ‘마로니에의 도시’로도 불린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키이우 거리에 마로니에를 대대적으로 심었고 나무는 도시의 상징이 됐다. 2018년 키이우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수로 선호하는 나무를 조사한 결과 부동의 1위는 마로니에였다. 2020년 5월29일 현지 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키이우는 마로니에를 그리워해’라는 기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마로니에가 자라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키이우시의 입장도 옮긴다. “우리 시의 마로니에가 최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전에 없던 곤충의 가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픈 나무들에 학자들이 처방한 약도 주입할 예정입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얼마 뒤 러시아는 키이우를 침공했다. 마로니에가 심어진 거리 곳곳이 폭격을 맞았다.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키이우의 마로니에는 알고 있으려나.
1975년 서울대학교는 교정의 나무 칠엽수와 본관(현 예술가의 집) 건물을 남긴 채 관악산 아래로 이사했다. 학교가 떠나자 그곳은 있는 그대로 마로니에공원이 됐다. 젊음의 낭만과 시대의 저항과 대학생들의 고뇌가 가득했던 공원은 나무와 함께 공연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우리 아빠도 젊은 시절 거기서 마로니에라 불리는 나무를 만났을까. 그의 꽃과 열매를 유심히 관찰했을까. 나처럼 식물을 좋아했을까. 물어보진 못했다.
꽃 핀 마로니에 나무(1887년, 빈센트 반 고흐) 출처 반고흐미술관
노래를 품는 시간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로니에는 열매와 이파리 모두를 제 몸에서 떼어놓을 것이다. 나목으로 선 채 자신의 겨울눈만큼은 모질게 지킬 것이다. 꽃 피던 시절은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꽃을 품는 시간에 들 것이다. 요즘 부쩍 아빠가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 지던 날/ 루루 루루 루루루 루루루 루루 루루루…”
허태임 식물분류학자·‘숲을 읽는 사람’ 저자
※연재 소개: 식물학자가 산과 들에서 식물을 통해 보고 듣고 받아 적은 익숙하지만 정작 제대로 몰랐던 우리 식물 이야기. 4주마다 연재.
마로니에공원에서 보자는 말이 대학로에서 만나자는 말보다 더 좋다. 마로니에(Marronnier)는 가시칠엽수라는 나무. 밤나무를 닮아 밤(Marron)을 어원으로 하는 프랑스 말이다. 받침이 하나도 없는 이 단어가 주는 특유의 리듬감과 이국적인 정취가 나를 끌어당긴다.
나는 어릴 때 아빠가 즐겨 부르던 노래에서 마로니에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눈물 속에 봄비가 흘러내리듯/ 임자 잃은 술잔에 어리는 그 얼굴…” 찾아보니 1971년 박건이 발표한 노래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이다. 아빠는 서울에서 마로니에공원을 오가며 사진을 배웠다고 했다. 아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빠는 어린 나와 언니를 마당의 키가 큰 감나무나 마을 어귀의 품이 너른 팽나무 아래 나란히 세워두고 사진을 자주 찍었다. 오래된 올림푸스 카메라 렌즈에 한쪽 눈을 갖다 대거나 떼면서 루루 루루 루루루, 아빠는 노래를 불렀고 나는 미지의 마로니에를 상상했다.
마로니에. 일러스거래량이동평균선
트레이션 차지우.
열매 떨어질 때 나는 가을의 소리, 슈슈슉 (침묵) 툭
대학로가 아니라 마로니에공원이 약속 장소로 호명될 때, 그래서 나는 평소보다 좀더 들뜨는 편이다. 아빠가 우리를 보며 행복하게 웃던 어린 날의 추억이 떠올라 일부러 그 노래를 찾아 듣는다. 아빠가 마로니에공원체리마스터 다운
을 드나들던 청춘일 때 나는 다만 우주의 보이지 않는 먼지였을 테지만.
마로니에 열매. 출처 영국 런던 아쿠아가든
지금은 가을의 초입이다. 마로니에의 큼지막한 열매가 무르익어 뚝뚝 떨어지는 때. 나는 요즘 이 열매가유진테크 주식
떨어지면서 내는 소리가 재밌어서 수목원의 마로니에 옆에 서서 자주 웃는다. 마로니에 잎은 작은 이파리가 다섯 장에서 많게는 일곱 장이 모여 커다란 손바닥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도 칠엽수다. 거인의 손처럼 크고 넓다. 몇 장만 겹쳐도 무성한 느낌이 든다. 녹음수로 무척 좋은 것이다. 꼭대기에 달린 열매가 땅으로 내리려면 그 잎들을 통과해야 한다. 이평선매매
나무로부터 낙하를 시작한 열매는 커다란 이파리들이 이룩한 수풀을 헤치느라 샤샤샥 소리를 먼저 낸다. 반달 모양의 수관(樹冠)을 다 통과한 후엔 잠시 침묵한다. 그러고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툭 하고 착지한다. 열매 하나 떨어질 때 샤샤샥-침묵-툭, 또 하나 떨어질 때 샤샤샥-침묵-툭. 동시에 여러 개가 떨어지면 수선스럽기까지 하다. 샤샤샥과 툭 사이의 그 침묵 덕분에 떨어지는 열매를 내가 피할 시간이 생긴다. 마로니에 열매야말로 머리에 맞기라도 하면 제대로 꿀밤이다.
나무의 다른 부위가 아니라 열매가 정말 밤톨을 닮았다. 그런데 마로니에와 밤나무는 전혀 다른 혈통이다. 달리 말해 열매만 닮은 거다. 밤처럼 표면에 가시가 있고 그 껍질을 벗기면 밤톨을 닮은 게 나온다. 그래서 마로니에의 영어 이름도 말밤나무(Horse chestnut)다. 식용 밤은 아니라는 뜻에서, 또는 잎이 떨어진 후 나뭇가지에 남는 흔적이 말발굽 모양이라서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마로니에 열매를 콩커(Conker)라고 부르기 때문에 곳에 따라 콩커나무(Conker tree)로도 통한다.
마로니에 열매를 실에 매달아 서로 쳐서 깨는 영국 아이들의 놀이도 열매 이름을 그대로 써서 콩커라고 한다. 가을 초입에 마로니에가 있는 교정에 가면 키가 큰 나무에 달린 열매를 떨어뜨리려고 학생들은 자기 신발을 벗어 던졌다. 열매를 최대한 구하려고 이 나무 저 나무 찾아다녔다. 마로니에 아래 있던 많은 아이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앞으로 옮겨 갔다. 그럼에도 콩커 열기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건 ‘세계콩커선수권대회’가 있어서다. 이 대회는 1965년 시작되어 해마다 10월 둘째 주 일요일에 영국 노샘프턴셔주 애슈턴에서 열린다.
콩커 방식은 단순하다. 매듭이 있는 끈 끝에 마로니에 열매를 꿰고 두 선수가 준비한다. 더 강한 열매가 더 약한 열매를 부수면서 점수를 얻는 것이 룰이다. 끈에 매달린 두 개의 열매 중 하나가 부서질 때까지 번갈아가며 튕긴다. 끈의 길이와 끈을 매듭짓는 방법, 타격하는 횟수의 제한 등 국제적으로 정한 참가 규칙 또한 엄격한 편이다. 아이들끼리 놀 때는 열매를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식초에 담그거나 뜨거운 오븐에 굽는 등 저마다의 편법을 쓴다.
영국에선 놀잇감으로, 독일에선 맥주 저장고 보호수로
콩커 게임 이외의 목적으로 영국 정부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아이들을 동원해 마로니에 열매를 모은 적이 있다. 총알과 폭탄 등에 쓰이는 화약인 코르다이트(Cordite) 생산에 필요한 일종의 전분이 마로니에 열매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추억이 많고 프랑스 말이 잘 어울리는 마로니에지만, 그의 진짜 고향은 그리스 북부와 알바니아의 산지다. 17세기 초 영국으로 건너간 마로니에는 18세기에 활약한 조경사 케이퍼빌리티 브라운(1716~1783)의 총애를 받으며 전국 곳곳에 식재됐다. 재배지에서 벗어나 1815년 야생에서 처음 기록됐고, 심어 기르지 않아도 저절로 살 수 있게 됐다. 영국에 귀화한 것이다. 19세기에는 유럽의 더 많은 국가로 건너갔고 오늘날 프랑스 베르사유궁전과 파리의 샹젤리제 거리, 센 강변의 대표 나무가 됐다. 독일에서는 양조장 정원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기계식 냉장 시설이 도입되기 전에는 양조업자들이 맥주의 발효와 숙성을 위해 지하 저장고를 팠다. 여름철 더위로부터 저장고를 보호하기 위해 잎이 무성하되 뿌리가 얕아 땅속 시설에 해가 되지 않는 나무가 필요했다. 마로니에였다. 그렇게 이어진 마로니에 녹음 아래에서 맥주를 파는 풍습은 비어가르텐(Biergarten)으로 발전했다.
마로니에는 최대 40m까지 자랄 수 있다. 큼지막한 잎 덕분에 우듬지에서 내려온 반달 모양의 수관부가 유독 더 풍성하다. 봄에 꽃이 말도 안 되게 화려하게 핀다. 그 모습이 내 눈에는 무성한 잎사귀 사이에서 우후죽순 솟은 빵빠레(바닐라) 아이스크림처럼 보인다. 고흐의 1887년 작 ‘꽃이 핀 마로니에 나무’에 내가 본 그 개화 풍경이 딱 들어가 있다. 실제 개화 시기에 나무 가까이 다가가 꽃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빵빠레보다는 뭐랄까, 하얀 바탕에 붉은 무늬가 들어간 것이 그 비슷한 아이스크림 더블비얀코를 더 많이 닮은 것도 같다.
마로니에공원에 가도 사실 진짜 마로니에는 몇 그루 안 된다. 서울대학교가 경성제국대학이던 시절, 일본인 교수가 마로니에라고 심은 것이 유럽 원산의 마로니에(가시칠엽수)가 아니라 일본 원산의 칠엽수라 그렇다. 접두어 ‘가시’가 안 붙은 칠엽수는 말 그대로 열매에 가시가 없다. 마로니에(가시칠엽수)와 칠엽수, 그 둘을 크게 구분하지 않고 마로니에로 통칭하던 때도 있었다. 최근에 심는 가로수는 둘의 관계를 정확하게 구분한다. 때로는 마로니에를 더 많이 심는 경향도 보인다.
마로니에 원뿔모양 꽃차례. 출처 미국 일리노이 모튼수목원
키이우는 마로니에가 그리워
진짜 마로니에를 그것도 고목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은 마로니에공원이 아니라 덕수궁이다. 덕수궁 석조전 뒤 두 고목이 그 주인공인데 수령이 100년이 넘은 것으로 본다. 석조전 정원이 완성된 것이 1910년대 초반이니 적어도 그 무렵 또는 그 이후 심었으리라 짐작해서다. 지금까지 알려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마로니에다.
마로니에를 가슴 가장 깊은 곳에 두고 사는 국가는 아마 우크라이나가 아닐까 싶다. 그중에서도 도시 키이우. 키이우는 수많은 광장에 이 나무가 가득해 ‘마로니에의 도시’로도 불린다. 19세기 전반에 걸쳐 키이우 거리에 마로니에를 대대적으로 심었고 나무는 도시의 상징이 됐다. 2018년 키이우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수로 선호하는 나무를 조사한 결과 부동의 1위는 마로니에였다. 2020년 5월29일 현지 언론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는 ‘키이우는 마로니에를 그리워해’라는 기사에서 심각한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로 마로니에가 자라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전한다. 키이우시의 입장도 옮긴다. “우리 시의 마로니에가 최근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기후변화로 전에 없던 곤충의 가해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아픈 나무들에 학자들이 처방한 약도 주입할 예정입니다.” 그 기사가 나가고 얼마 뒤 러시아는 키이우를 침공했다. 마로니에가 심어진 거리 곳곳이 폭격을 맞았다. 전쟁이 도대체 언제 끝날지 키이우의 마로니에는 알고 있으려나.
1975년 서울대학교는 교정의 나무 칠엽수와 본관(현 예술가의 집) 건물을 남긴 채 관악산 아래로 이사했다. 학교가 떠나자 그곳은 있는 그대로 마로니에공원이 됐다. 젊음의 낭만과 시대의 저항과 대학생들의 고뇌가 가득했던 공원은 나무와 함께 공연과 예술과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 우리 아빠도 젊은 시절 거기서 마로니에라 불리는 나무를 만났을까. 그의 꽃과 열매를 유심히 관찰했을까. 나처럼 식물을 좋아했을까. 물어보진 못했다.
꽃 핀 마로니에 나무(1887년, 빈센트 반 고흐) 출처 반고흐미술관
노래를 품는 시간
가을이 깊어갈수록 마로니에는 열매와 이파리 모두를 제 몸에서 떼어놓을 것이다. 나목으로 선 채 자신의 겨울눈만큼은 모질게 지킬 것이다. 꽃 피던 시절은 그리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꽃을 품는 시간에 들 것이다. 요즘 부쩍 아빠가 부르던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된다. “아 청춘도 사랑도 다 마셔버렸네/ 그 길에 마로니에 잎이 지던 날/ 루루 루루 루루루 루루루 루루 루루루…”
허태임 식물분류학자·‘숲을 읽는 사람’ 저자
※연재 소개: 식물학자가 산과 들에서 식물을 통해 보고 듣고 받아 적은 익숙하지만 정작 제대로 몰랐던 우리 식물 이야기. 4주마다 연재.